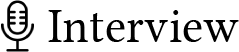요리는 사랑을 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화과자(和菓子)는 찹쌀가루, 쌀가루 등으로 만든 반죽에 팥소나 고물 등을 넣고 손으로 정교하게 빚은 뒤 쪄서 만든 일본의 전통 과자다. 모양이 예뻐서 흔히 꽃 화(花)를 쓸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본의 전통 문화를
뜻하는 온화할 화(和)를 쓴다. 그러나 만들면서 소중한 사람을 떠올리며 웃고, 과자의 아름다운 모양을 보며 웃고, 먹으면 은은한 단맛에 또 웃게 되는 걸 보면 사람을 꽃처럼 피어나게 하는 과자일지도 모른다.
오늘은 태안발전본부 IGCC발전처 발전부 현승섭 기술과장, 김포발전본부 경영지원부 이정현 대리, 감사실 청렴감찰부 송재혁 사원이 화과자 만들기에 도전했다. 세 사람에게 요리는 이미 익숙한 일상이다. 군 시절 취사병을
하며 요리를 배웠다는 송재혁 사원은 결혼 후 집에서 요리사를 자처한다. 그에게 요리는 소중한 사람에게 내어줄 수 있는 가장 큰 마음이자 책임이다.
이정현 대리에게 요리는 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숙제이자 작은 행복이다. 이정현 대리는 “보통 아이가 잘 때가 가장 예쁘다고들 하지만, 저는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이 가장 예뻐요. 특히 제가 만든 음식을 먹고
아이들이 엄지를 치켜세울 때면 정말 행복합니다”라고 말한다. 다만 오늘은 아내에게 직접 만든 디저트를 선물하고 싶다며 화과자 클래스를 신청했다.
현승섭 기술과장은 요리를 ‘소통의 창구’라고 표현한다. 사택 주변에 식당이 많지 않아 시작한 요리가 어느새 동료들과도 나누는 취미가 됐다. 다만 제과는 아직 미지의 영역이라 이번 기회에 화과자를 확실한 ‘주특기’로
만들고 싶다고 말한다.

소중한 사람을 떠올리며 완성한 여섯 가지 화과자
오늘 클래스의 주제는 ‘크리스마스 화과자 6종 만들기’. 화과자 강사는 쌀가루와 찹쌀가루를 쪄서 색을 입힌 반죽과 유자, 초콜릿, 말차, 흑임자 등 다양한 맛의 앙금, 쇼트닝과 모양틀, 마지팬 조각칼 등 준비물을
미리 갖춰 두었다.
식물성 쇼트닝을 손에 살짝 바르고 반죽을 동그랗게 빚어 매끈하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 관문이다. “주름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쉽지 않네요.” 현승섭 과장이 반죽을 만지며 난도를 체감하는 사이, 이정현 대리는 “저
잘했죠?”라며 자랑스럽게 자신의 반죽을 들어 보인다. 본격적으로 산타 모양 화과자를 만들기가 시작되자 공방 안 분위기가 사뭇 진지해진다. 빨간 반죽을 얇게 펴서 초코 앙금을 넣어 동그란 모양을 만들고 모자를 씌운 뒤
체에 반죽을 눌러
털처럼 보이게 만들어 붙여야 한다. 체에 반죽을 누를 때마다 구름이 피어나듯 수염 모양이 나타나자 다들 신기한 듯 눈이 동그래진다. 꼭 개구쟁이 소년으로 돌아간 듯한 얼굴이다. 이제 수염과 눈, 코를 붙인 뒤
금가루까지 뿌리면 비로소 하나의 화과자가 완성된다. 과정은 간단해 보이지만 여기까지 수십, 수백 번의 손길이 거친다. 손에 쇼트닝을 발라 반죽이 달라붙지 않게 하고, 모양틀로 나뭇잎 모양을 찍고, 마지팬 조각칼로
반죽을 자르고 다듬는 등 도구를 바꿔 가며 부지런히 손을 움직여야 한다.
첫 작품부터 만만치 않자 송재혁 사원이 “다음엔 사 먹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스쳤어요”라며 웃는다. 요리 고수에게도 쉽지 않았던 모양이다. 이정현 대리는 “손으로 뭘 만드는 데 소질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 제
손도 금손이네요. 가족을 생각하니까 더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라며 자신감을 드러낸다. 실제로 이정현 대리는 시작 전에는 “동료들 사이에서 제가 가장 속을 썩일 것 같아요”라고 걱정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에이스”라는 칭찬을 독차지했다. 세 아이의 아빠로 길러 온 섬세함이 반죽에도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과자가 아닌 작품, 예술을 뛰어넘는 행복
순조롭게 화과자를 만들어 가던 도중 이정현 대리가 “으악” 하고 비명을 질렀다. 들고 있던 트리 모양 반죽을 바닥에 떨어뜨렸기 때문이다. 낙담한 듯 보이는 이정현 대리에게 현승섭 기술과장과 송재혁 사원이 “초반에
실수해서 다행이에요. 얼른 다시 시작하세요”라며 용기를 북돋는다. 이정현 대리는 “속을 썩일 것 같다는 말이 씨가 됐어요”라면서도 동료들의 응원에 다시 심기일전한다.
나머지 두 사람도 색 반죽을 얇게 밀어 별과 눈 결정 등을 찍어내고, 각자 개성에 맞게 트리를 완성한다. 이렇게 산타를 시작으로 리스, 포인세티아, 트리, 눈꽃까지 여섯 가지 화과자가 하나둘 완성돼 갔다.
같은 화과자라도 모양마다 만드는 과정이 다르고, 그 안에 담긴 사람의 마음도 제각각이다. 현승섭 기술과장은 하나하나 화과자를 빚어낼 때마다 아버지, 회사 부장님, 결혼을 앞둔 후배와 동료들 얼굴을 차례로 떠올렸다.
평소 직원들에게 요리를 자주 해주는 이유를 묻자 “업무 안에서 다 챙겨주지 못해 늘 미안한 마음이 커요. 그래서 밥 한끼, 디저트 하나로라도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라는 현승섭 기술과장. “고생해서 만든 화과자인데
남 주기에 아깝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에도 “회사 동료들에게 주는 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라고 단호히 답한다.
송재혁 사원에게 오늘 만든 작품은 ‘딸에게 주는 첫 과자’라 의미가 컸다. “아빠가 직접 만든 산타와 포인세티아 과자가 오래도록 아이의 기억 속에 남으면 좋겠습니다”라며 그는 꽃처럼 환하게 웃어 보인다. 연말이면
연인들이 공방에 많이 찾아온다는 강사의 말에 “다음에는 아내, 딸과 함께 오고 싶어요”라는 다짐도 더했다.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탐험가의 마음으로 한 알, 몰랐던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며 한 알, 소중한 사람을 떠올리며 또 한 알. 오늘 상자 안에 담아 간 화과자는 단순히 디저트가 아닌, 세 사람에게 찾아온 크리스마스 그
자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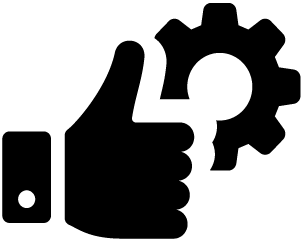 원 포인트 업
원 포인트 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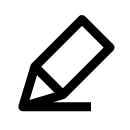 글.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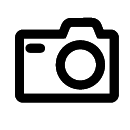 사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