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겨울 바다로 몸을 깨우는 시간
개그맨 김준현은 최고의 맛을 느끼기 위해 그에 걸맞는 몸 상태를 만든다고 했다. 한여름에 냉면을 먹기 전 에어컨을 틀지 않고 이동하고, 한겨울에 순댓국을 먹기 전에는 주문 후 외투를 걸치지 않고 밖에 서 있는다고.
이처럼 워밍업이 필요해 여수 땅을 밟은 후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성두마을이다.
성두마을은 여수에서도 가장 남쪽 끝에 자리하고 있다. 한적한 어촌마을이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조용하지만 한 때는 이 작은 곳에 500여 명의 주민들이 살 정도로 활기찼다. 그렇다고 해서 이곳이 마냥 조용한
것만은 아니다. tvN에서 방영한 〈언니네 산지직송2〉 촬영지이기도 하고, 여수의 대표 낚시 포인트이기도 하다.
성두마을을 여수 여행의 첫 번째 포인트로 삼은 이유는 걷기 좋아서다. 작은 동네지만 걷는 동안 지루하지 않다. 정박하고 나가기를 반복하는 배가 만드는 바다 풍경은 보는 것만으로도 평화롭다. 물론 배를 타고 나가는
사람은 양 손이 무겁길 바라며 묵직한 하루를 바라고 있을 테다. 그들의 삶의 무게를 전혀 알지 못하는 외지인의 눈에는 그저 겨울 바닷마을의 낭만적인 풍경이다.
푸른 하늘과 푸른 바다 사이에 혼자 도드라진 자태를 보이는 끝등전망대도 성두마을에서 눈길을 끄는 곳이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남쪽 끝에 펼쳐진 바다는 그동안 마음속에 묵혀 있던 삶의 체증을 시원하게 내려주는
최고의 소화제다. 이곳에서는 행운이 따른다면 멸종위기종 토종 돌고래, 상괭이를 볼 수 있다고 한다. 이 외에도 걷는 동안 곳곳에서 만나게 되는 풍화혈도 성두마을의 시그니처다. 꽤나 큰 구멍이 뚫려 있는 거대한 바위는
자연이 장기 프로젝트로 완성한 예술품이다.

비어 있을 틈이 없는 시장의 맛
실컷 걸었으니 이제 본게임으로 들어갈 차례다. 여수에 온 진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수수산물특화시장에 도착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지? 아뿔싸! 매 달 첫째, 셋째 화요일은 정기 휴무란다. 하지만 전혀 당황할
것 없다. 이곳은 여수다. 절대 배 곯게 할 일이 없는 바로 그 여수. 잠시 혼미해진 정신을 바로 하고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 올라탔다. “이 근처 가볼 만한 시장에 내려주세요.”
급하게 목적지를 변경하여 다다른 곳은 여수교동시장. 이곳도 수산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여수의 대표 시장이라고 한다. 아직 장을 볼 만한 시간 대는 아니라 인파로 가득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썰렁하지도 않았다.
이리저리 구경하다 끌리는 것을 발견하면 구매하려는 낯선 여행자에게는 이정도가 딱이다. 좌판은 그야말로 보물창고다. 말린 생선, 갈치 그리고 봐도 전혀 알 수 없는 많은 종류의 해산물들. 뭐가 되었든 이제 고르기만
하면 된다.
“방어회 가능할까요?” “누가 지금 여기서 방어회를 먹어요.” ‘겨울=방어회’라는 공식을 아무 때나 적용하려는 ‘식재료 무식자’ 티를 이렇게 냈다. 이내 주인은 “오늘 아침 들어온 쥐치랑 줄돔 가져가세요. 지금은
이게 딱이에요”라며 권했다. 좋다고 하니 솜씨 좋게 회를 떠 깔끔하게 담아주었다. 제일 먼저 쥐치를 집어 들어 간장에 톡 찍어 한 입. 쫀득한 게 일품이다. 이번에는 깻잎 위에 초장을 찍은 쥐치, 마늘, 고추를
올리고 또 한입 넣었다. 아, 그래 이게 바로 여수의 겨울맛이다.



시장의 소란도,
골목의 짭조름한 바람도,
디저트 가게에 퍼진 달콤한 향도
묘하게 어우러져 하루의 결을 만든다.
그렇게 한 끼 한 입이
차곡차곡 쌓이고 나면
어느새 겨울이
더 이상 차갑지만은 않다.
달콤하게 여행을 봉인하는 마지막 한 조각
먹는 여행의 엔딩은 역시 디저트다. 맛집이 줄지어 있다는 이순신광장에 도착하면 여행자들의 발길이 자연스레 향하는 곳이 있다. 바로 여수 디저트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꼬북샌드’. 여행 선물로도 손색없고, 이동 중
주머니에서 하나 꺼내 먹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야말로 ‘여수표 달콤 휴식’ 같은 존재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귀여운 거북이들이 먼저 반긴다. 벽면 곳곳에는 꼬북샌드의 캐릭터가 있고, 한편에는 〈포켓몬스터〉의 ‘꼬북이’가 자리한 포토존이 있어 주문도 하기 전부터 사진 찍고 싶게 만든다. 공간은 작지만
디저트 가게 특유의 따뜻한 온기와 버터 향이 은근하게 퍼져 ‘먹기 전부터 맛있다’는 확신을 준다.
가장 중요한 건 맛. 꼬북샌드는 바삭한 버터쿠키 사이에 크림치즈를 가득 넣은 수제 샌드쿠키로, 한입 베어 물면 쿠키가 가볍게 부서지며 꾸덕한 크림이 고소하게 퍼진다. 플레인, 레몬, 블루베리, 누텔라, 해풍쑥까지
다섯 가지 맛이 있어 취향에 따라 고를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단 하나만 먹기’가 어려운 이유다.
세트 박스를 들고 나가는 손님들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여행을 마무리하며 가족에게, 친구에게, 혹은 내일의 나에게 작은 달콤함을 선물하려는 사람들. 그렇게 꼬북샌드를 들고 나서는 순간, 여수가 품은 맛의 기억이 손끝에
또 하나 더 얹힌다.
여수의 겨울은 결국 ‘먹는 재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마음 한 모퉁이가 따뜻해지는 경험으로 이어진다. 시장의 소란도, 골목의 짭조름한 바람도, 디저트 가게에 퍼진 달콤한 향도 묘하게 어우러져 하루의 결을
만든다. 그렇게 한 끼 한 입이 차곡차곡 쌓이고 나면 어느새 겨울이 더 이상 차갑지만은 않다. 이 도시가 주는 온기는 배를 채우는 순간에만 머물지 않고 오래도록 여행자의 마음을 데워놓는다. 다음 겨울에도 여수가 다시
떠오른다면, 그것만으로 이미 이 여행은 충분히 성공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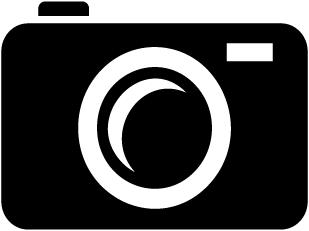 빛나는 그곳에
빛나는 그곳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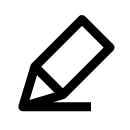 글.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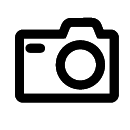 사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