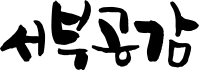자연 그대로
생명력의 복원
생명력의 복원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윤종민 박사
산, 강, 바다는 물론 새와 물고기, 나무, 꽃은 모두 저마다의 생명력을 가지고 스스로 생겨나고 발전한다. 자연의 의미는 원래 그러했다. 그러나 저마다의 힘이 스러져만 가는 요즘이다. 다행히도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에서는 생명을 지켜내려는 고군분투를 이어가고 있다.
Q. 요즘 기후 위기가 곧 생태계의 위기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현재 생물종이 겪는 중인 멸종위기에 대해 알려주세요.
대진화(Macro Evolution)라는 개념이 있는데 한 종이 생성하고 멸종하는 것을 진화의 과정이라 여겨요. 한 종이 사라지고 생겨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요. 그렇기에 사라지는 생물종을 복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면 문제를 파악할 수 있어요. 지구는 오래전부터 여러 번의 대멸종(Mass Extinction)을 겪었습니다. 1차 대멸종은 고생대 오르도비스기 말(4억 4,300만 년 전)에 일어났고, 2차 대멸종은 고생대 데본기 말(3억 7,000만 년 전)이라고 알려졌지요. 시간을 뛰어넘어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의 멸종을 홀로세(Holocene) 대멸종 또는 인류세(Anthropocene) 대멸종이라 부릅니다. 신생대 제4기 홀로세에서 인류세에 걸친 시기에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인류세란 인류가 지구 기후와 생태계를 변화시켜 만들어진 새로운 지질시대를 뜻하지요. 2017년 환경부는 야생생물 267종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했고, 지난해 12월 멸종위기종을 282종으로 개정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평가를 거쳐 멸종위기종을 지정하고 해제하는 과정에서 개체 수가 지속해 증가하고 있고요.

▲ 현장에서 철새의 이동을 관찰하는 윤종민 박사
Q. 정리하자면 이 시대를 인간이 기후와 생태계에 영향을 주어 변화를 이끄는 인류세라 할 수 있고, 현재 진행 중인 대멸종으로 사라지고 있는 생물종의 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대멸종이라 판단할 때 나타나는 공통 징후가 있습니다. 약 30% 이상의 식물, 동물 종이 멸종하고 특정 생물군이 아닌 여러 생물군에서 멸종이 나타나며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지요. 또 상대적으로 매우 짧은 시간에, 한 가지나 혹은 연관성이 있는 일련의 사건에 의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공통 징후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지요. 지금의 기후변화는 기후 위기라고 표현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근에서야 멸종위기의 야생생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태 감수성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1960~1970년대 경제 개발에 집중하던 시절에는 폐수나 매연을 무분별하게 방출했지요. 그러는 동안 호랑이나 표범, 크낙새, 소똥구리 같은 종은 한반도에서 절멸했습니다.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사라지는 종이 계속 늘어갈 것입니다.
Q. 생태계는 개별적이지 않다고 하던데요.
하나의 생물종은 다른 무수히 많은 생물종과 생태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한 종이 사라지면 적어도 30종 이상의 종이 연쇄적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합니다. 우리가 왜 멸종위기종 보호에 힘써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는 대목이지요.
Q.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일이 곧 멸종위기종의 보호이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조류팀에 속해 멸종위기에 처한 새를 복원하는 일을 하지요. 검은머리갈매기, 양비둘기, 저어새, 참수리, 황새의 동태를 파악하고요. 전국 분포 조사를 통해 핵심 서식지에 있는 위협요인을 찾아 이를 저감하는 활동을 합니다. 가락지나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공간좌표를 수집하고 분석해 철새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도 하고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전국의 인구통계를 내듯이 새의 분포를 조사한 후 멸종위기종의 보전과 관리에 힘을 싣는 일을 하는 것이지요.

▲ 검은머리갈매기 둥지의 포식자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하는 모습

▲ 알을 구조한 후 인공 부화를 유도하는 모습
Q. 보전과 관리에 힘을 싣는다는 것을 더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멸종된 개체를 수입해 사육장에서 증식한 후 자연에 돌려보내는 데 중점을 뒀어요. 그런데 개체 수를 늘려 자연에 돌려보내도 결국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살아남는 게 쉽지 않지요. 그 때문에 요즘은 이러한 과정과 더불어 서식지를 개선하는 데 힘을 싣고 있어요. 언급한 대로 멸종위기종의 안정화를 위해 서식지를 보전하고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는 거지요.
Q. 어렵지만 중요한 일을 위해 힘을 보태기 원한다면요?
식목일 아침이면 종종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던 한 애니메이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프랑스 작가 장 지오노(Jean Giono)가 1953년에 발표한 동화 <나무를 심은 사람(L’homme qui plantait des arbres)>을 원작으로 리메이크해 제작한 동명의 영화이지요. 프로방스의 알프스 끝자락, 어느 황량한 계곡에서 살아가던 양치기 노인이 반백 년 동안 꾸준히 도토리를 심어 그곳이 풍요로운 숲으로 변모하는 것이 중심 스토리입니다. 위협에 처한 멸종위기종을 지키는 사람들은 곧 이 영화의 양치기 노인과 같지요. 꾸준히 도토리를 심듯이 우리 곁의 생물을 지킨다면 우리는 풍성한 숲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지역 단위의 공존협의체가 멸종위기종과 서식지를 자발적으로 보호하는 활동이 활발해지기를, 우리 사회가 ‘공존(共存)-공유(共有)’의 연계성을 이해하며 함께 살아감의 생명력을 이어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 황새에게 먹이를 제공하고 관찰한 현장

▲ 멸종위기에 처한 양비둘기
 CLOSE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