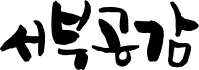돌아온 멸종위기종
저어새
저어새
2020년 1월, 무등산 국립공원에서 멸종 위기 야생 동물들이 잇달아 발견됐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에 발견된 야생 동물은 멸종 위기 야생 생물 1급 수달, 2급 독수리, 하늘다람쥐, 삵, 담비, 수리부엉이, 참매 등이라고 밝혔다. 동물원에서만 볼 수 있던 멸종 위기 야생 동물의 발견은 무등산 생태계가 건강을 되찾고 있다는 증거다.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온 멸종 위기 야생 동물들에 대해 알아보자.


강인한 외모 속 여린 성격, 저어새
저어새는 크고 넓적한 부리, 가느다랗고 긴 다리, 하얀 깃털을 지녔다. 생김새가 독특해 멀리서도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저어새라는 이름은 주걱처럼 생긴 넓은 부리로 물 속을 젓는 특이한 사냥법 때문에 붙여졌다. 몸 전체가 흰 깃털로 덮여있고, 눈 주위나 다리, 부리가 까매서 영어권에서는 ‘Black-faced Spoonbill’로 부른다.
저어새는 우리나라 서해안에 번식하는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이다. 동아시아에만 서식하는 철새이며, 한국, 홍콩, 대만, 일본, 베트남 등에 분포한다. 저어새과에 속하는 새는 노랑부리저어새, 황제저어새 등 세계적으로 10여 종이 있다. 이 중 ‘저어새’(과의 이름과 종의 이름이 같다)가 번식을 위해 겨울철 한국으로 날아온다.
2010년 이전까지만 해도 저어새는 정확한 생태가 밝혀지지 않은 동물이었다. 하얀 몸에 검정 가면을 쓴 모습이 마치 용감한 전사 같아 보이지만 경계심이 강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정확한 번식지를 찾기 힘들었다. 그러던 2000년 7월 강화군 갯벌 일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서 갯벌 생태계가 건강을 되찾기 시작했다. 이러한 결과로 강화 갯벌을 찾는 물새가 많아졌다. 여기에 저어새도 포함된다.


환경 복원의 가능성과 결실을 보다
저어새의 개체 수가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 수는 과거보다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 저어새의 수가 줄어든 이유는 갯벌 매립으로 인한 서식지 감소와 환경오염에 따른 질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DDT로 인한 환경오염이 크게 작용했다. DDT는 1940년대부터 널리 사용된 살충제다. 잘 분해되지 않아 땅과 물에 남아 있어 먹이사슬 상위층에 속한 생물에 축적됐다. 그 결과 상위 포식자인 새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 국립생태원 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86년 DDT 사용을 중지했고, 그 후부터 저어새의 개체 수가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만약 DDT 사용이 계속됐다면 저어새는 이미 멸종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2006년까지만 해도 국제자연보전연맹과 국제조류보호회의는 저어새를 ‘10년 이내 멸종 확률 80%로 추정되는 멸종위기 조류’로 분류했다. 하지만 그간 정부 부처와 지역 주민의 갯벌 생태계 보호 활동이 지속되면서 저어새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 도 우리는 저어새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서식 환경을 개선하고 보전 및 복원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생태계 환경 복원이 멸종위기종 증가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결과를 확인한 만큼 오염된 환경을 복원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CLOSE
CLOSE